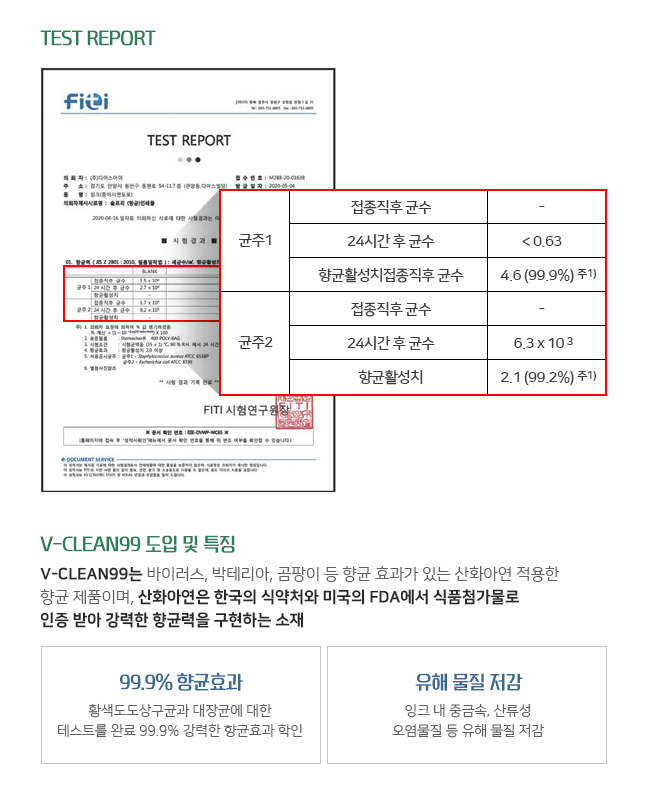가을이 무르익어 지나던 게 엊그제였는데, 어느새 시베리아처럼 매서운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설(瑞雪)이 내린 날, 도비산 부석사에 오릅니다. 본래 제 자리인양 산세의 흐름 따라 옹기종기 들어선 절집을 보면 인위적인 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연과 하나처럼 어 우러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서산 부석사가 그러한 절입니다. 이름도 같지만 산세 와 어우러짐 또한 봉황산과 하나처럼 보이는 영주 부석사만큼이나 빼어납니다. 특히 눈 내린 부석사 풍경은 정겹고 따뜻합니다.
도비(島飛)면 어떻고, 도비(桃肥)면 어떠랴!
부석사를 품고 있는 산이 도비산입니다. 도비산에 대한 어원은 분명치 않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당시 산이 중국에서 날아왔다 하여 ‘島飛山’ 이라 하기도 하고, 복숭아꽃이 많이 피어 ‘桃肥山’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또한 다른 옛 사료에서는 ‘都飛山’으로도 적혀 있다고도 합니다. 고문헌에 실린 도비산에 대한 첫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인데, 이 사료에는 ‘都飛山’으로 표기되어 있고 <대동여지도>에는 ‘島飛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도(島, 桃, 都)’ 자를 쓰더라도 어색함은 없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도비산은 산 허리춤을 감싸고 복사꽃이 만발합니다. 또한 천수만이 간척되기 전에는 도비산 지척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렸다고 하니 먼발치에서 바다와 어 우러진 도비산의 모습은 충분히 떠있는 섬처럼 보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도비산 에 올라서면 이제는 넘실대던 바다 풍경은 볼 수가 없고 대신 한 야심가에 의해 개발된 드넓은 천수만 간척지의 허허벌판만 휑하니 눈에 들어옵니다.
부석사, 자연스러워서 자연스러운
이런 도비산은 산 중턱 적당한 곳에 부석사를 아늑하게 품고 있습니다. 도비산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와 이름도, 창건 설화도 같습니다. 아마도 신라 시대 의상 대사가 창건했다는 설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같이 쓰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설화를 뒷 받침할 만한 고증도 없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처럼 국보급 문화재도 없지만 도비산 산 세와 마치 하나인 듯 잘 어우러진 풍경은 도비산 부석사가 보여주는 진면목입니다.
절이 들어선 모습 자체가 산의 결을 따라 거스름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레 배치되어 그 모습 자체가 아늑합니다. 큰 절에 가면 종종 느끼는 위압감이나 근엄함을 서산 부석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도, 절 주위를 지키는 아름드리나무들도 경직됨이 없어 말 그대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찾는 발걸음들 또한 느릿하여 자연스러워지며 금세 절과 하나 의 모습으로 동화됩니다. 굳이 신앙인이 아니어도 누구든 한 번쯤 눈 내리는 날 부석사에 올라 발아래 풍경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위안과 휴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행과 힐링과 휴식을 하기에는 산사(山寺)만큼 좋은 곳도 드물겠지만, 특히 서산 부석사는 그 ‘자 연스러움’이 인근의 개심사와 함께 내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을 만큼 빼어납니다.
마음, 비우고 다시 채우기
긴 겨울의 시작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게는 긴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연명을 해야 하는 생명체들에게는 시련 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음장 밑 냇물은 쉼 없이 흐르고, 땅속에서는 생물들이 치열하게 새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수에 유유히 떠있는 오리의 쉼 없는 갈퀴질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리해야겠지요. 비록 혹한의 계절에도 ‘먹고살기’ 위해 고군분투해 야 하지만,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묵은 것 비워내기를 겨우내 하 다 보면 봄이 올 무렵에는 새로운 것들로 마음 가득 채워지겠지요. 마음으로 오는 엄동의 시절은 서둘러 돌려보내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자양분을 축 적하는 시절로 남은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저도 마음이 잘 따 르지 않는다면 바람처럼 훌쩍 길 떠나 부석사 운거루 앞에 서서 소담히 눈 덮인 천수만 벌판을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편액에 걸린 글귀 하나 마음에 담아오세요. 맑은 차 우려내듯 두고두고 마음에서 우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